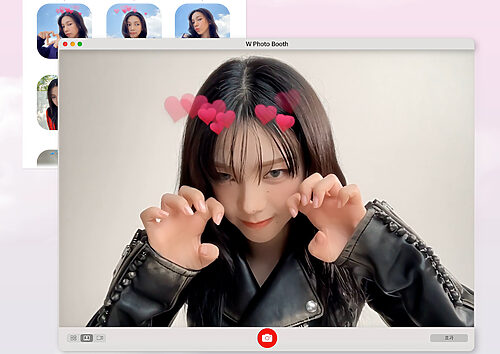때로는 패션에도 해설이 필요하다. 에디 슬리먼처럼 복잡미묘한 사고를 하는 디자이너의 컬렉션은 더욱 그렇다

1, 3, 6. 존 발데사리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총 브로치와 클러치 겸 크로스백. 2. 전반적으로 미디 길이의 굽과 키튼 힐이 많이 쓰였다. 4. 슬리먼 합류 이후 코스튬 주얼리의 강조가 눈에 띈다. 원석을 장식한 링 시리즈. 5,7. 반짝이는 글리터 부츠 시리즈. 8. 화려한 스터드 장식은 에디 슬리먼의 대표적 취향.
오해는 가끔 쓸데없는 분노를 야기하곤 한다. 무언가를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는 인물일수록 그런 오해를 받을 확률이 높다. 패션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에디 슬리먼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프런트로에서부터 스탠딩석까지 거의 각도 차이가 없는 객석 탓에 앞 줄의 벽에 막혀 온전한 룩을 감상하기 힘들었던 파리 컬렉션의 생로랑 쇼에서, 에디터가 본 것은 큼지막한 금색 봉이 휘휘 허공을 가르는 무대 장치와 가지런하게 5:5 가르마를 탄 모델들의 정수리뿐이었다. 이 문제적 무대 디자인은 에디 슬리먼이 직접 한 것이라고 했다. 겨우 봉쇼와 헤어쇼를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부른 거냐고 화를 낼 뻔했다. 그런데 홍콩에서 열린 2014 F/W 프레젠테이션에서 생로랑의 옷을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고 들어보니 비로소 알게 되었다. 생로랑 파리 컬렉션은 말하자면 한 편의 ‘종합예술’임을. 룩은 전반적으로 1960년대 디자인과 색을 기본으로 이브 생 로랑의 60년대 작품을 주로 참고했고, 여기에 팝 아티스트 존 발데사리(John Baldessari)의 작품에서 영감 받은 요소를 내세웠다. 60년대에 유행한 사다리꼴 모양의 트라페즈 실루엣을 기본으로 한 초미니스커트와 케이프, 오버사이즈 코트 등이 주 아이템이며, 반짝이는 글리터 부츠와 메리제인 베이비스 펌프스를 매치해 스타일을 완성했다. 인디 밴드 음악에 심취해있고, 거리의 어린 뮤지션을 데려다가 모델로 세울 정도로 음악광인 에디 슬리먼은 진부한 패션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친 60년대 청소년의 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스쿨걸 룩, 만화적인 팝아트 프린트, 고고 부츠 등은 모두 그가 열광적으로 집착하는 ‘젊음’과 맞닿아 있다. 사실 컴백 이후, 에디 슬리먼은 굵직한 트렌드를 제안하기보다는 보여주고 싶은 것을 독자적으로, 그리고 심각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포장해 내놓는 데 주력해왔다. 아마 현시점의 패션계에서 이렇게까지 트렌드를 무시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디자이너는 미우치아 프라다와 에디 슬리먼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생로랑 컬렉션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이제는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쇼 배경으로 사용된 체리 글레이저의 음악,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오프닝을 맡은 모델 그레이스 하첼의 기괴한 아름다움, 권총 무늬로 대표되는 존 발데사리의 팝아트에 60년 대 스윙 런던의 필터가 합쳐져 재탄생한 생로랑식 청춘”이라고. 누구나 언젠가는 잃게 되기에, 눈부시게 아름답고 그리운 젊음에 대한 찬가라고 말이다.
- 에디터
- 패션 디렉터 / 최유경
- 기타
- COURTESY OF SAINT LAURENT by HEDI SLIMA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