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음이 더욱 아름다운 할배 할매들에게 바치는 젊은 8인의 달뜬 편지.

버지니아 울프
영화 <디 아워즈> 마지막 장면, 니콜 키드먼이 연기한 버지니아 울프가 돌멩이를 주머니에 가득 넣은 채 똑바로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카메라가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비추는 동안 낮게 깔린, 바스러질 듯 메마른 울프의 중얼거림이 들려온다. “삶을 정면으로 보는 것. 언제나, 똑바로 마주 보는 것. 그리고 그 자체로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 마침내 이해하게 되는 것. 그 자체로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치우는 것.” 울프는 자신이 말한 그대로 살았다. 어떤 환상도 없이, 삶의 맨 얼굴을 직시하고자 했다. 아니 그녀의 예민한 정신은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생생한 날것의 삶을 두 시간 동안 구경하는 것은 힘들었다. 어쩌면 그녀가 추구한 것이야말로 무모한 환상이었고, 그녀는 그 환상에 잡아먹혔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다인가? 예순의 나이에 자살한 그녀에게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은 늙음과 성숙 같은 단어보다는 여전히 시퍼렇게 빛나는 예민한 정신이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부서질 듯 섬세한 창에 삶의 진리를 비추어보고자 했다. 아마도 봤을 것이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리고 어느 날, 미련 없이 그것을 치우고 떠났다. 그녀와 정반대의 늙은이들이 세상엔 많이 있다.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다.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칭송한다. 여전히 생명력이 넘치는 늙은이들. 성공했고, 식지 않은 야망으로 가득 찬. 확신 속에서, 인생을 즐기는 화려한 백발의 늙은이들. 가끔 그런 그들을 쳐다보고있으면 죽음을 잊은 암세포처럼 괴이하게 느껴진다. 죽음을 모르는 늙음은 이상하다. 삶은 죽음과 함께하는 것이므로. 그러니 삶을 이해하는 것은 죽음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하여 그것을 보고 만지고, 마침내 받아들이는 것, 치우는 것. 그것이 늙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특권이라면, 울프는 그것을 아주 잘 누리고 갔다. – 김사과(소설가)

알렉스 퍼거슨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아이러니하게도 트위터의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는 트위터 관련 최고 명언(?)이다. 이 발언의 주인공은 바로 박지성의 스승으로 유명한 축구 감독 알렉스 퍼거슨. 41년생, 뱀띠로 77년생인 나와는 띠동갑인, 작년에 은퇴를 선언한 축구계의 살아 있는 전설이다. 퍼거슨의 이력을 조금만 훑어보면, 그가 왜 트위터를 포함한 SNS를 인생의 낭비라고 말했는지를 알 수 있다. 간단하게, 그는 축구밖에 몰랐던 사람이다. 오죽했으면 축구 외의 것에 한눈을 판다는 이유로, 정확하게는 연예인과 결혼한 게 못마땅해서 저 유명한 백암 선생(필자주 : 데이비드 베컴)을 과감하게 쫓아냈겠나. 역으로, 그가 박지성을 향해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며 찬사를 보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지성 선수가 SNS 하는 거 봤나? 결론은 그러니까, 다음과 같다. ‘넓게 파는 것이 곧 깊게 파는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나로서는 저렇게 오로지 하나의 분야에만 매진할 줄 아는 사람이 존경스럽다. 나는 참 바쁘다. 나름 라디오 작가니까 책도 봐야 하고, 만화책도 좀 챙겨야 하며, 새벽에는 게임 삼매경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어디 그뿐인가. 평양냉면 맛집까지 찾아 다니고, 영화도 종종 봐야 한다. 이거 참, 퍼거슨 감독이 알았다면 당장 인생에서 ‘퇴갤’당할 수준이다. 맞다. 그러고 보니, 직업적 본분이라 할 음악 감상을 깜빡했다. 내가 좀 이 모양이다.
오늘도 나는 퍼거슨 감독 같은 ‘외길 인생’을 동경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도 어쩌겠나. 게임이나 만화, 음식 평론가가 될 것도 아니고, 좀 더 괜찮은 음악 평론가가 되기 위해서는 조만간 오로지 내 작업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다. 내 나이 서른일곱. 3년 뒤인 사십부터는 음악 평론계의 알렉스 퍼거슨을 꿈꿔본다. 지금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넓고 탄탄한 기반을 닦기 위함이라고 믿으면서. – 배순탁(음악평론가, <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 <애프터클럽> DJ)

제인 버킨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이 하나 있다. 제인 버킨과 실비 바르탱이 세르즈 갱스부르의 양팔에 안긴 채, 셋이 함께 립싱크를 하며 노래 부르는 영상이다. 제인 버킨의 미소를 보기 위해, 그 영상을 여러 번 돌려 보곤 했다. 몹시 불행하다고 느낄 때 그 미소를 보면 어쩐지 위로가 됐다. 너무나 행복에 겨워, 저런 행복이 정말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게 만드는, 그래서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순수한 미소였다. 어머니이자, 뮤즈이자, 아티스트로 살아온 제인 버킨은 언제나 나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해주는 존재다.
그녀가 3·11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으로 날아가 위문 공연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언젠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되었을 때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젝트 <이야기해주세요> 음반을 들고 그녀를 찾아갔을 때도, 그녀는 할머니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해주었다. 공연을 막 마치고 몹시 피곤한 와중이었을 텐데도,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감탄과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이 평생 누린 행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무엇이든 힘 닿는 데까지 주려고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생각했다.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그녀처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내가 누린 행복에 보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늙음’을 향해 가야겠다고. – 송은지(뮤지션, 소규모아카시아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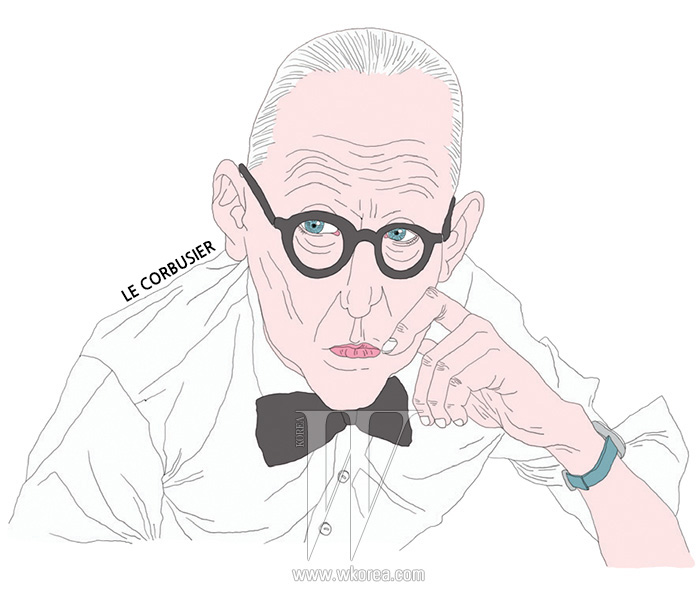
르코르뷔지에
건축가로서의 삶은 내내 무겁고 육중한 것을 다루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일상의 가치들을 구현하는 것이다. 17세에 팔레주택을 계획한 것을 시작으로 78세에 사망할 때까지 수많은 건물, 도시를 계획했던 르코르뷔지에. 나는 인도 아메다바드의 방직협회회관, 찬디가르의 도시 계획, 롱샹 성당 등 그의 건축을 직접 들어가 걷고 머물러볼 기회가 있을 적마다, 조형 언어를 넘어 건축이 이토록 총체적으로 빛과 공간을, 인간의 삶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구나 새삼 감탄하곤 했다. 그런데 인구 300만을 위한 도시 계획 등 건축과 도시를 통한 사회 개혁을 꿈꾸며 새로운 개념을 주장했던 그가 생을 마감한 마지막 집은 프랑스 남부 캡 마르탱의 4평짜리 통나무집이었다.
젊어서의 건축은 (혹은 삶은) 넘치는 욕망과의 힘겨루기다. 땅의 잠재성, 프로그램의 잠재성, 현재와 미래 그 무엇 하나 놓치고 싶지 않지만, 이상적인 계획은 결국 핵심을 향해 선택하는 과정이다. 아직 서투른 욕심과 싸우는 나는 그의 살아서의 마지막 4평 집과 죽어서 아내와 함께 묻힌 묘와 묘비의 디자인에서 나의 꿈의 노년을, 동시에 궁극의 건축을 본다. 삶에서도 그리고 죽음에서도 그의 마지막 건축은 더 이상 덜어낼 것 없는 집이었던 것이다. 그의 소박한 살아서의 집과 죽어서의 집을 통해서 건축은 건축 밖의 모든것이라고, 그가 삶의 끝에서 공기처럼 속삭이는 듯하다. 나의 노년도 젊은 날의 불같은 정열을 남김없이 태운 후에 그렇게 나긋나긋, 수직과 수평이 그러하듯 삶과 죽음이 서로 상보적이라던 르코르뷔지에의 말처럼 ‘수직에 대한 수평으로’ 수렴하는 그것이었으면 한다. – 조재원(건축가, 01_스튜디오 소장)
- 에디터
- 피처 에디터 / 김슬기
- 아트 디자이너
- Illustration / HONG SEUNG PY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