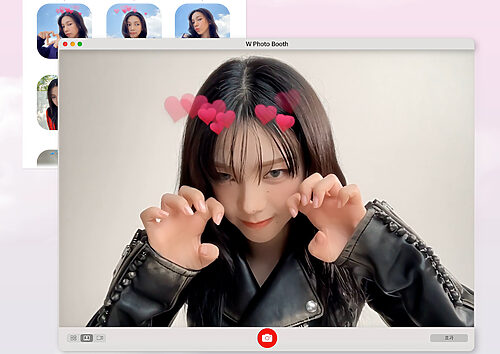문단 권력의 괴물을 비판한 시인에게 선뜻 시집을 내주겠다고 나서는 출판사는 없었다. 최영미는 1인출판사를 차리고, 6년 만에 새 시집 <다시 오지 않는 것들>을 냈다. 은유의 세상과 씨름하던 시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구체화된 사업의 길로 나선다는 것. 그 사적인 과정과 기억을 최영미가 말한다.

출판사를 차려야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먼저 한 일은 노트북 수리였다. 얼마 전에 낸 시집 <다시 오지 않는 것들>에 실린 ‘2019년 새해 소망’이라는 시에도 썼듯이 ‘화면과 자판의 이음새가 깨져 테이프로 고정한 노트북으로 책상 위의 괴물과’ 싸울 수는 있지만, 접지도 못하는 노트북으로 어떻게 편집에서 제작 발주 주문 배본을 차질 없이 할 것인가? 거래처인 배본사와 서점의 주문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도 큰일인데, 노트북이 고장이라도 나면 어쩌나. 새로 시작하는 출판 사업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컴퓨터부터 고쳐야 했다.
이음새가 떨어져 접지도 못 하는 노트북을 헝겊 가방에 욱여넣고 버스를 타고 S전자서비스센터에 갔다. 하얀색 테이프로 덕지덕지 기운 내 노트북을 보더니 수리기사가 ‘이러고도 여태 고장 나지 않은 게 신기하다’며 한 마디 던진다. 테이프를 붙여놓은 2년 동안 내 노트북은 집 밖 구경을 한 적이 없다. 자판이 뚝 떨어질까 봐 접지도 않고 늘 펼쳐놓은 상태에서 내 방에 모셔놓았으니,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톱이나 마찬가지. 이틀 뒤에 내 물건을 찾으러 갔더니 그는 내게 ‘도대체 어떤 테이프를 썼냐’고 물었다.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아 수리하기도 전에 진이 빠지도록 고생했다는 그에게 나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시인의 방을 사업자의 방으로 만드느라, 가구를 없애고 재배치하느라 고생 좀 했다. 꽤 큰 원룸이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이리저리 배치도를 짜봐도 책상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책상 없이 출판사 업무를 볼 수는 없다. 팩스도 들여놔야 하고, 서점들과 신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넣을 서랍도 필요했다. 오랫동안 나는 책상 없이, 서랍이 딸린 책상 없이 살아왔다. 지금은 사라진 원목 식탁에 노트북을 얹고 책상 삼아 사용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머니 침대를 들여놓을 공간이 모자라 친구에게 식탁을 줘버렸다.
그러고 나서 작은 경대의 오른쪽 구석에 화장품을 몰아놓고, 경대의 왼편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생활하며 재판도 하고 시도 썼다. 시를 쓰는 데 꼭 책상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책상이 없어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못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나니 이런저런 걱정이 들었다. 새로 나올 책은 어디에 쌓아두며 주문서와 거래명세서는 어디에 두고 관리하나? 봉투는 어디에 두나? 1인출판사 대표로서 많은 업무를 혼자 처리하려면 먼저 효율적인 사무 공간 배치가 필수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책이며 사무집기를 수납해야 한다. 시인의 방을 출판사 대표의 방으로 변모시키려 몇 날 며칠 머리를 쥐어짜며 무진 애를 썼다.
결국 어머니가 가끔 명절에 오시면 쓰는 싱글 침대를 없앴다. 어머니의 침대를 버리고, 책상을 새로 하나 들였다. 어머니에게 죄송했지만 내 사업이 잘되어야 어머니 간병에도 차질이 없을 테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는 내 공간에 덩치 큰 물건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서랍이 두 개 이상 달리고 가로 폭이 1.2m에 가격이 저렴한 원목 책상이 나의 로망이었다.
인터넷에서 ‘책상’을 검색하고 가구 매장을 두어 군데 방문해 내게 맞는 책상을 찾느라 한 달가량 허비했지만, 내 맘에 드는 물건을 찾지 못했다. 낙담한 나는 어느 봄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상을 사야지, 결심하고 홍대 부근의 가구 거리를 걷다가 마이 퍼니처 카페에 들어가 내가 원하는 치수와 모양의 책상을 주문했다. 맞춤 가구 전문점이고 천연 나무를 사용하면서도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아, 드디어 오랜 고민 끝! 깊은 서랍이 두 개나 딸린 소나무 책상이 내 집에 들어온 뒤 모든 일이 술술 풀리지는 않았지만, 사무를 볼 책상이 생기니 어찌나 마음이 든든하던지.
팩스를 살까 말까? 기계를 싫어해 팩스기를 새로 들여놓기가 망설여졌다. 출판사에서 일한 지인이 추천한 전자팩스는 배우기가 어려웠다. 어떤 팩스를 사야 하나? 오래 망설이다 S전자 홍대점에서 파는 가장 싼 팩스기를 샀는데 여태 고장 없이 잘 굴러간다.
표지 디자이너에게 본문을 넘긴 뒤에도 시집 제목을 정하지 못해 애를 태우다 ‘시인의 말’을 쓰며 떠오른 ‘다시 오지 않는 것들’로 정했다. “가슴을 두드렸던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았다”는 문장에서 나온 문구인데, 민감한 시기에 내는 책이라 제목도 표지도 무난하게 가는 게 옳거니 싶었다. 마티스의 그림으로 디자이너가 만든 강렬한 표지들을 버리고, 결국 나는 무난하고 밋밋한 휘슬러 그림을 골랐다.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낸 책은 처음이다. 2016년경에 SNS를 시작하고 처음 내는 시집이라 제목과 표지 후보를 카톡방과 페이스북, 블로그에 올려 의견을 구했다. 여러 사람의 뜻을 받들어 제목을 ‘헛되이 벽을 때린 손바닥’으로 정하고, 그 제목으로 멋진 표지가 나온 뒤에 추천사를 부탁하러 시인 문정희 선생님을 만났다. “제목에 ‘헛되이’가 들어가면 최영미의 모든 노력이 ‘헛되어’질지 모른다” “말이 운명이다”라는 문 선생님의 충고를 듣고 마음이 약해진 나는 ‘헛되이’를 포기했다.
본문 교정을 보며 표지를 만들었고, 인쇄소와 배본사를 정하는 것도 큰일이었다. 주변에서 추천한 두어 곳에 견적을 구했는데 비슷비슷한 가격이 나왔다. 디자이너의 거래처인 H 인쇄소로 낙점하고(그래야 그녀가 일하기 편할 테니까), 인쇄소에 시집 2천 부의 제작 발주를 넣어야 하는데, 발주서라는 걸 써본 적이 없는 나는 허둥지둥. 한글이 아닌 엑셀로 발주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무서웠다. 누구에게 부탁할까? 고민 끝에 박물관에서 일하다 지금은 대학교수인 후배 Y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나의 SOS에 응답하여 하루 만에 엑셀을 배워 발주서를 써서 내게 보내왔다. ‘언니- 다음에도 또 할게요.’ 필요하면 언제라도 연락하라는 그녀의 문자를 받고 나는 감동했다. 1인출판사를 차리고 시집을 내는 과정에서 나는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들의 도움이 헛되지(!) 않게 이미출판사를 잘 키우고 싶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 읽다가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책을 만들며,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 피처 에디터
- 권은경
- 글
- 최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