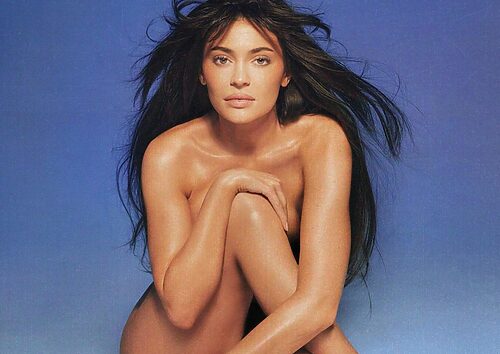한국의 전통적이고 촌스러운 물건들이 언제부터인가 외국인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스카프는 에르메스의 2019 S/S 컬렉션 중 ‘보자기의 예술(Lárt du Bojagi)’.
아마존에서 ‘코리아 굿즈’가 요즘 난리다. 호랑이 무늬가 그려진 극세사 담요는 부드럽고 따뜻하다며 별점을 후하게 받고, 경북 영주 대장간에서 만든 호미는 견고한 만듦새와 실용성에 ‘혁명적’이라는 단어까지 붙여가며 찬사를 보낸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영화 <킹덤>의 영향으로 ‘갓’까지 등장했다. 이것은 좀비 영화인가 모자 영화인가 싶을 만큼 조선 시대 양반들이 쓰던 독특한 아이템에 서 양 힙스터들이 열광한다. 화이트 티셔츠처럼 심플한 룩에 매치하겠다는 사뭇 진지한 태도로 말이다(패션에 있어서 두 발짝 앞서가는 에즈라 밀러는 이미 작년에 한국 팬이 선물한 블랙 두루마기에 갓을 모던하게 소화해 미국 LA에서 공연을 펼친 바 있다). 2011 S/S 컬렉션에서 한복과 갓을 모티프로 한 쇼를 선보인 캐롤리나 헤레라 역시 어쩌면 너무 빨랐는지도 모르겠다. 1888년 ‘조선의 모자 패션은 파리지앵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 프랑스 민속학자 샤를 바라의 예측이 2019년에야 비로소 적중한 것일까? 한국의 힙이란 21세기가 아닌 19세기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닐까? 때 마침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에서 <굿모닝, 조선> 전시가 6월 말까지 열리고 있다. 거기에 가면 조선 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모자와 생활용품 등 가양각색의 전통 유물 70여점을 발견하며 조선의 힙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다.
한국적인 것 가운데 뭐가 가장 힙하게 느껴지냐는 단도직입적 질문에 ‘한복(Hanbok)’이라고 답한 해외 패션 피플도 있었다. 오버사이즈 핏과 볼륨감, 화려한 컬러와 장식, 그야말로 오트 쿠튀르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에르메스 2019 S/S 컬렉션에서 ‘보자기의 예술(L’art du Bojagi)’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인 스카프는 한복에 장식으로 활용되거나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보자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디자이너 알린 오노레(Aline Honoré)는 디자인을 구상하던 중 우연히 한국 자수 박물관을 방문하여 보자기에 큰 영감을 받았다. 패치워크 기법을 디자인에 반영한 에르메스의 아름다운 보자기 스카프는 전통과 새로움, 과거와 현대가 정사각형 프레임 안에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다.
도자기에 관해서라면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을 알고 있다. 남다른 미감을 보여주는 신사동 ‘메종 드 유지’에 가면 여기가 헤어숍인지 박물관인지 싶을 만큼 아름다운 백자가 창가에 보기 좋게 놓여 있다. 옷도 시계도 가구도 다채로운 빈티지, 앤티크 제품을 원 없이 가져보고 누려본 어느 한 남자의 안식처이자 종착지를 보는 느낌이랄까. 언제부터인가 그가 자신의 공간을 온통 도자기로 채우기 시작했다. 늘 결연한 마음으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을 때마다 방문하는 그곳에서 자기가 전하는 고요한 에너지를 받곤 한다. 마치 의식처럼 커트하기 전에 그가 내려주는 다기에 담긴 우롱차 한 잔을 음미한다. 주인장은 각박한 삶 가운데서 심리적 여백이 필요한데 그것을 도자기가 채워준다고 말한다. 요가원 갈 때와 비슷한 마음으로 헤어숍을 찾는다. 여기가 서울의 그 어느 곳보다 힙한 정신의 헤어숍이 아닐까 생각하며.
외국인의 시각에 새롭고 힙하게 느껴지는 잇 아이템의 출현이 해프닝처럼 계속되고 있다. 이런 기세라면 한강변에 펼쳐진 은박지 돗자리가 21세기 펑키한 퓨처리즘 양탄자로 취급받는다거나 건식 족욕기가 스몰 스파라며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장면도 조심스레 예측 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가 2019년 2월 일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재래시장에서 쇼핑하고 싶은 아이템’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품목은 언젠가 베트멍 런웨이에서 본 듯한 화려한 꽃무늬가 가득한 ‘요술버선’이었다. 색깔도 다양한데 저렴하고 따뜻하기까지 하단다. 이 외에 양말, 스틱커피, 스테인리스 반찬통, 고무줄 바지와 같은 촌스럽지만 실용적인 아이템이 순위에 올랐다. 남대문, 동묘 앞, 광장시장, 경동시장 등 서울의 재래 시장은 한국의 스웨그를 보여주는 대표 스폿이다.
해외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이 이구동성으로 재래시장을 꼭 가고 싶어 하는 이유도 ‘한국의 힙’을 찾고 싶어서일 터. 어딘지 모르게 키치하고 귀여우며 때때로 심하게 아방가르드한 한국적인 사물과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말이다.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누군가는 거기서 한 줄기 영감을 얻기도 한다. 영국의 핫한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디노브(Kiko Kostadinov)는 한국에 왔다가 동묘 앞에서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 ‘Best street in the world’라는 찬사와 함께, 아재와 할배들의 스트리트 룩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 요상한 형광 컬러 레이어드, 배바지와 통바지의 향연, 액세서리로 이용한 검은 봉다리와 등산 힙색까지, 우리에겐 오히려 남루해 보이는 룩이지만 그에겐 정말이지 이 세상 힙이 아닌 것이다. 스포티즘과 고프코어(아웃도어 패션)로 무장한 이토록 어글리한 멘즈웨어라니! 광장시장을 방문한 미국인 친구는 왜 미국보다 더 예쁜 미제 구제가 서울에 더 많으냐며 흡족하게 랄프로렌 치노 팬츠를 안고 조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한국인에겐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이라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 외국인의 눈엔 신기하고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 간판으로 둘러싸인 거리, 을지로나 문래동의 인터스트리얼한 풍경을 바라보며 외국인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여기가 ‘사이버 펑크의 나라’입니까? 지난 2월에 개막한 디 뮤지엄 전시 <I Draw: 그리는 것보다 멋진 건 없어>를 위해 서울을 찾은 독일 출신의 아티스트 스페판 막르크스(Stefan Marx)는 청계천의 공구상가, 을지로 인쇄소, 사이키델릭한 조명과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움직이는 LED 간판이 너무 쿨하게 느껴졌다고 짤막한 소감을 전했다. 많이 놀아보고, 많이 본 사람들에게 한국 그리고 서울의 어떤 면면은 영감 그 자체가 되어준다. 한국의 힙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의 눈에든 지금 이곳을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든 일상 속 작은 발견의 기쁨을 선사한다.
- 피처 에디터
- 김아름
- 포토그래퍼
- 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