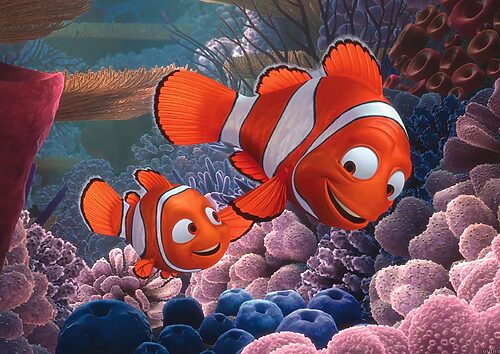수 세기를 지나 다시 트렌드 반열에 오른 후프 스커트

종이를 구긴 듯한 질감의 원형 드레스는 언더커버, 링 이어링은 로헤트 코레 두프하, 레이스업 슈즈는 인다코 제품.
19세기 중엽, ‘패션의 피해자(Fashion Victim)’라는 표현은 비극을 일컫는 대명사와도 같았다. 1858년 3월 16일, <뉴욕타임스>에 젊은 여성의 비극적인 사고 관련 기사가 실렸다. 보스턴 비컨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피해자는 당시 대부분의 여성이 즐겨 입던 폭이 넓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벽난로의 불이 후프 스커트에 옮겨붙으며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당해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영국에서만 비슷한 사고로 숨진 사상자가 최소 19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화재 사고로 일주일에 세 명씩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경각심을 갖고 본인의 행동에 극도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천만한 옷차림은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현대적 관점에서 남성 우월주의와 여성 혐오적 시각이 가득한 해당 기사는 무척 거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로 실용성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크리놀린, 즉 후프 스커트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점이다. 1850년대에 유행한 텐트 모양의 폭이 넓은 치마를 일상복으로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를 고정하는 속옷, 즉 후프 스커트는 결혼식이나 시상식, 패션쇼에서 지금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2023 S/S 시즌에는 후프 스커트의 활약이 뜨거웠다. 로에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나단 앤더슨(Jonathan Anderson)은 선반을 연상시키는 각진 허리 실루엣이 돋보이는 티렝스(Tea-Length) 드레스를 내놓았고, 그동안 볼록하고 둥근 실루엣을 고수하던 꼼데가르송의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는 골반의 각진 곡선을 강조하는 드레스를 선보였다. 한편 크리스토퍼 케인(Kristopher Kane)은 넓고 뻣뻣한 재질의 허리끈 위에 얇은 레이스를 덧대 관능적인 피카부 후프(peekaboo hoop) 드레스를 완성했다. 디올의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Maria Grazia Chiuri)는 벨(Bell) 모양 실루엣에 몇 가지를 변형했는데, 짧고 경쾌하거나 바닥을 쓸 정도로 긴 길이로 위엄이 느껴졌다. 이탈리아 귀족 출신의 프랑스 왕비 카트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édicis)의 코르셋에서 영감을 얻은 치우리는 “신체 곡선을 재해석하는 데 있어 후프 스커트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신의 디자인을 설명했다.

후프 드레스, 쇼츠, 피시넷 삭스, 플랫폼 부츠는 디올 제품.

튜브톱 드레스와 펌프스는 로에베 제품.
카트린 왕비가 즐겨 입은 후프 스커트는 후기 르네상스 시대 유럽 왕실에서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다. 1500년대 초 이 유행의 선구자는 포르투갈 출신의 조안이라는 여성이었다. 그녀에게는 혼외 자식이 두 명 있었는데, 불륜과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등나무와 지푸라기를 엮어 만든 후프 스커트를 입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의복이 곧 ‘베르두가도(Verdugados)’, 즉 ‘파팅게일(Farthingale)’ 양식이 되었다. ‘녹색 막대기’를 뜻하는 옛 단어가 기묘하게도 현대에는 사형 집행인을 뜻하는 ‘베르두고(Verdugo)’의 어원이 된 것이다. 약 10년 뒤 이 흥미로운 의복 양식은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건너갔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의상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패션사를 가르치는 패션 역사학자 제시카 글래스콕(Jessica Glasscock)은 베르두가도 패션이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당시 왕실 초상화를 보면 베르두가도 복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8세기에 이르러 ‘파팅게일(Farthingale)’ 패션은 불어로 바구니를 뜻하는 ‘파니에(Panniers)’ 스타일로 발전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보디 셰이퍼인 파니에는 대나무같이 속이 빈 줄기나 고래 뼈로 만들었는데, 파팅게일처럼 원 모양 실루엣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양쪽에 걸쳐 있는 치마를 넓은 직사각형 판 모양으로 부풀려 늘어뜨렸다. 이로 인해 허리가 잘록해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 비교적 적당한 사이즈가 있었던 반면 어떤 것은 치마폭이 매우 넓어 마치 식당 테이블보를 입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다. 때로 보조 테이블이 연상되는 경첩을 추가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문을 비롯한 모든 출입구를 드나 들 때마다 치마 옆면이 가라앉는 상황이 일어났다. 글래스콕은 “파팅게일과 마찬가지로 한때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파니에가 얼마 지나지 않아 상위 시민 계층에도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한다. “상류층의 복식을 받아들이고 모방하면서 개개인이 ‘패션’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은 18세기부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를 과시하는 패션의 유행은 1790년대를 기점으로 잠시 주춤했는데,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의 영향이 지대했다. 화려한 옷감, 폭이 넓고 사치스러운 파니에는 민심을 잃고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한 앙투아네트가 즐겨 입은 옷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그간의 풍성하고 커다란 파니에 대신 신체 곡선을 드러내는 기둥 형태의 의복이 자리 잡게 되었다. 1850년대 들어서 오스트리아의 사교계 명사 파울리네 메테르니히(Pauline Metternich)가 등장하기 전까지 말이다. 프랑스 황실에 파견된 궁정 대사인 남편을 따라 프랑스로 건너온 그녀가 커다란 치마를다시 부활시켰기 때문이다. 글래스콕은 그녀를 ‘졸리레이드(Jolie Laide)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라 평가한다. 비록 수려한 미모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독보적인 패션 감각과 재치를 지닌 여성이었다는 것이다. 나폴레옹 3세의 황후 외제니 드 몽티조(Eugénie de Montijo)와 친분을 쌓은 그녀는 현대에 ‘오트 쿠튀르 패션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영국의 디자이너 찰스 프레드릭 워스(Charles Frederick Worth)에게 황후를 소개했고, 외제니 황후를 비롯한 측근 역시 파울리네의 스타일에 동참했다. 이를 시작으로 치마의 폭은 이전보다 더 과감하고 풍만한 실루엣으로 변화했다. 워스가 제작한 초창기 드레스는 뻣뻣한 질감의 리넨 끈과 말 털로 만든 속치마를 겹겹이 쌓은 디자인이었다. 드레스 폭에 따라 네 겹에서 많게는 여섯 겹씩 무게감 있는 보온재를 사용하다 보니 활동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디자이너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래 뼈나 속이 빈 나무줄기로 후프를 제작했고, 여러 겹이던 속치마 개수를 하나로 통일했다. 통기성은 물론 무엇보다 편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가격 역시 천문학적으로 비쌌기에 일반 서민은 덥고 불편한 속치마를 겹겹이 입을 수밖에 없었다.

튜브톱 드레스와 샌들은 조르지오 아르마니, 타이츠는 팔케 제품.
1856년 4월, R.C. 밀리에 사(社)가 금속 프레임으로 제작한 후프 스커트를 세상에 최초로 공개하면서 서민의 복식에도 해방의 물결이 일었다. 출시 후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수만 벌이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폭발적인 공급과 함께 접근성의 증가로 상품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글래스콕에 따르면 10년 사이 후프 스커트의 가격은 5달러에서 무려 25센트로 떨어졌는데, 이는 곧 대대적인 유행을 의미했다. 글래스콕은 이에 대해 이전의 유행이 상류층 사회 내에서만 돌고 돌았다면 19세기 중엽부터는 계층을 넘나드는 패션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이때부터 사회적 계급에 상관없이 여성이라면 후프 스커트를 입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설명한다.
대중적인 복식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해변가에서 머리 위로 치솟듯 바람에 날리는 스커트’ ‘약혼자를 치마폭으로 짓누르는 여성들’과 같이 후프 스커트를 주제로 한 풍자 만화도 탄생했다. 또한 치맛자락에 불이 옮겨 붙거나 마차 바퀴에 말려 들어가는 등 인명 피해에 대한 기사가 신문 1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글래스콕은 단점을 과장 보도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가부장제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다. 후프 스커트가 여성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허락한다고 생각해 화재의 위험성 같은 이야기를 과장해 강조하며 사회적 비판을 촉발했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한편 후프 스커트는 여성을 치한이나 원치 않는 성추행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가림막 역할을 하기도 했다. 큰 치마폭으로 인해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불쾌한 신체 접촉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움직일 때마다 주름을 찰랑거리며 나풀대는 치마의 모양새가 다소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복식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후프 스커트가 다소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후프 스커트를 입고 세상을 활보한다는 것은 ‘파워 포즈(Power Pose)’ 그 자체니까.

왼쪽부터/ 니트 코르셋 톱과 스커트, 암워머는 매티 보반X돌체앤가바나, 슬링백 슈즈는 아미나 무아디 제품. 튜브톱 드레스와 펌프스는 로에베 제품. 슬립 드레스는 랑방, 러플 장식 삭스는 팔케, 개더 장식 슈즈는 에이미 크룩스 제품. 풍성한 볼륨감이 인상적인 튤 드레스와 레이스 장식 톱은 파코 라반, 피시넷 삭스는 타비오,

키튼힐 슈즈는 아브라 제품. 커팅이 인상적인 레이스 소재 드레스는 크리스토퍼 케인, 노랑 타이츠는 팔케, 리본 장식 슬링백 슈즈는 아미나 무아디 제품.
- 에디터
- JENNY COMITA
- 포토그래퍼
- OSMA HARVILAHTI
- 모델
- Alice Stordiau(Bloom Management), Alyssa Sardine(Premier Model Management) Jiashan Liu(Silent Models), Marie-Agnès Diène(Claw Models)
- 스타일리스트
- HELENA TEJEDOR
- 헤어
- Yann Turchi(Bryant Artists)
- 메이크업
- Masaé Ito(MA World Group)
- 매니큐어
- Marie Rosa(Dior)
- 세트 디자이너
- Cristina Ramos(Magnet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