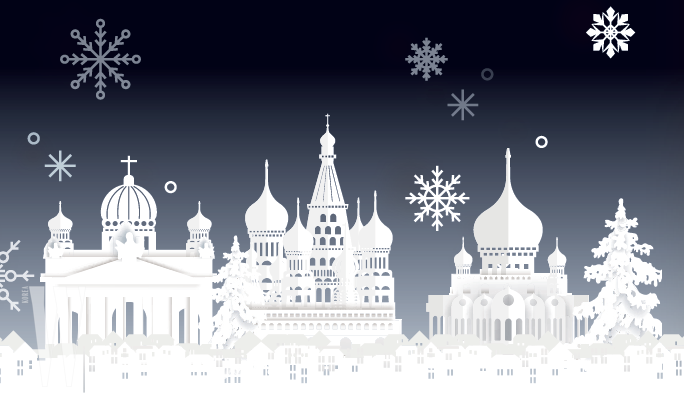타지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사람들이 조금은 쓸쓸하고 이따금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보내왔다. 고요한 낮과 거룩한 밤이 공존하는 그날의 선명한 기억 속으로.
브리즈번, 한여름의 판타지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예상치 못했던 이별이라 안절부절못하고 있는데 하필 크리스마스 시즌이 닥쳤다. 게다가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 더 얼떨떨했다. 내리쬐는 호주의 햇살 아래 트리는 어찌나 덥고 초라해 보이는지. 크리스마스가 여름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었고, 헤어졌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고, 한국은 영하 10도에 육박 한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고, 크리스마스이브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당연히 닭공장으로 오후 출근해서 크리스마스 특별 텐더를 양념해야 한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었다. 정말이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래도 이브 아이가. 일찍 끝내주지 않겠나.” 부산 출신의 친한 친구이자 동료가 클럽용 드레스를 꼭 챙겨 오라고 당부했다. 과연 그럴까. 피도 눈물도 없는 팀 리더는 예정 퇴근 시간보다 겨우 1 간 당겨 외국인 노동자인 우리를 보내주었다. 미친듯이 달려 마지막 기차를 타고 브리즈번 시티의 클럽에서 춤을 추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언제 그의 전화가 올지 모른다며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로 춤을 췄다. 돌이켜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연애의 뒤끝은 클럽 바닥에 흩뿌려진 술의 흔적처럼 끈적하게 남아 달라붙었다. 크리스마스날 점심때쯤 일어나 룸메이트와 산책을 나갔다. 가장 좋아했던 공원에 갔더니 배낭 여행객들이 산타 모자를 쓰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붙이면 좋을 만한 사진을 찍었다. 얼마 뒤, 남자친구를 다시 만났다. 그 사진을 보여주니 호스텔에 함께 머문 친구들이라고 했다. “네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내 말에 그가 다시 물었다. “이 사진에?” 아니, 낯설었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에. 내가 가장 외로웠던 순간에. 대답 하기도 전에 우리는 또 헤어졌고, 오직 이 사진만이 남았다. 그가 없어서 다행인 사진으로. 글 | 윤이나(<미쓰윤의 알바일지> 저자)
밴쿠버에서 맞는 세 번째 크리스마스
캐나다 밴쿠버 북쪽의 차가운 공기를 머금은 지루한 비가 마침내 그치면 온 도시는 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낯설고 요란했던 핼러윈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네 마다 옷을 갈아입느라 분주하다. 비석과 해골 장식이 난무한, 가끔은 섬뜩했던 집들이 아기 예수님과 산타 할아버지로 순식간에 포근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만 헛웃음이 난다. 이제는 다시 따뜻해져야 할 시간이다. 이맘때면 근처 꽃 시장에는 수백 그루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진열해두고 판다. 오직 이 시즌만을 기다리며 길러진 진짜 나무들이다. 은은한 겨울 향기를 품은 진짜 크리스마스트리로 장식하는 것이 여기 사람들의 로망이란다. 자동차 지붕 위에 저마다 고심해 서골랐을 그 큰 나무를 싣고 달리는 모습이란 얼마나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운가. 그러나 누구는 생각할 것이다. 그 나무 앞에 모일 사람들과 선물들, 웃음과 이야기, 소망과 기도. 두꺼운 외투를 꺼내는 것 말고도 여기 사람들은 이 특별한 계절에 성실하고 부지런히 반응한다.
캐나다에 온 첫해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를 낳았다. 병원에서 나와 그 핏덩이를 안고 집으로 오는 길에 눈이 내렸다. 엄마의 시간을 사는 동안 스탠 리 파크의 크리스마스 열차나 크리스마스 마켓의 회전목마는 꿈도 못 꿨다. 두 번째 겨울에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행여나 다칠까 트리 대신 작은 리스 앞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가족사진을 찍었다. 세 번째 맞는 올해는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기와 함께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미는 장면을 조심스레 꿈꿔본다. 문득문득 낯설고 외로워지는 이곳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을 고마워 하면서. 그렇게 나도 가장 따뜻한 이 계절을 맞이해보려 한다. 글 | 강나루(번역가)
모스크바의 이름은 빨강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밤 8시가 조금 넘어 도착했다. 모스크바스러운 초야를 보내고 싶은 급한 마음에 아에로 익스프레스를 뒤로하고 일단 택시를 잡아탔다. 눈밖에 보이지 않는 길을 30여 분 달리자 화려한 모스크바 시내가 나타났고, 나는 붉은광장으로 뛰어들었다. 1930년대에 시베리아 횡단을한 나혜석이나 된 듯, 레닌의 묘 앞 에서 흰 눈을 맞았다. 크리스마스를 굳이 그곳에서 보내려는 계획은 아니었으나 율리우스력을 쓰는 러시아의 두 번째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고 있었다. 옥수수 버터구이를 물고 깔깔거리며 키다리 피에로와 사진을 찍고 뱅쇼 한 잔으로 몸을 녹이며 모스크바 시민들을 구경했다. 언제부터인가 모피를 꺼리게 된 나지만, 밍크 털로 만든 코트를 입은 러시아 여인들의 차림이 거슬리지 않았다. 눈을 쓸어내리기 위한 밍크라니.
밤늦게까지 여는 국영 백화점인 굼에 들어가 그 위압감을 온몸으로 느낀 후, 일명 ‘굼스크림’을 맛보지 않을 수 없다. 크렘린궁 맞은편 6성 호텔 1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에 갔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식당은 성황 중. 김태희처럼 생긴 미녀들이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주문을 받으며 캐럴을 불러주고 사진도 찍어준다. 붉은 비트로 끓인 러시아 수프인 보르시와 예르미타시의 셰프 이름을 딴 올리비에 샐러드, 칭기즈칸의 기백이 그대로 느껴지는 러시아식 소고기 타르타르, 그리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러시아스러운 몇 개의 메뉴를 주문했다(랍스타로 크로켓을 만든 발상이라니). 캐비아는 내일을 위해 남겨두고, 모스크바 김태희가 추천한 세르비아산 스파클링 와인을 마셨다. 다음 날 조식으로 나온 러시아식 흑빵의 로망을 이루었음은 물론 노신사의 피아노 라이브 연주는 유럽의 그 어떤 화려한 호텔보다 노블한 시간을 선사했다. 영하 20도의 추위에도 성 바실리 대성당 앞 에는 이미 긴 줄이 섰다. 글 | 이상민(프리랜스 에디터)
- 피처 에디터
- 김아름